
미국에서 5월 두 번째 일요일이 Mother‘s Day가 된 것은 1914년 윌슨 대통령 시절이랍니다. 년 중 꽃값이 가장 비싼 시기가 어머니날이 있는 주인데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화훼농장에서 꽃을 적게 심어서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항만에서의 정체, 트럭 운송 문제 등으로 꽃값이 예년에 비해 25% 더 올랐다고 합니다.
한인들은 어머니날에 다른 미국인들처럼 꽃을 많이 사는 인종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마사지 기계 등등 실용적인 선물에 돈을 주로 쓰거나 맛 집으로 주로 모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사태로 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하는 작년부터 예년보다 훨씬 많이 꽃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날에는 좋은 식당은 웬만하면 예약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날에 비하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아버지이지만 이런 현상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도 대적할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젊은 남자들은 거의 울지를 않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최근에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날겁니다. 근데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하나같이 다들 엄숙해집니다.
군대에서 소대장 훈련받을 때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간의 유격훈력 가운데에 하루를 공수훈련 받는 게 있는데 10미터 막타워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예행연습인데 10미터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랍니다. 뛰어 내리기 바로 전에 조교가 훈련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애인~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머니~~”를 외치며 뛰어내립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인 중에서 미군기를 가장 많이 격추시킨 전설의 파일럿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중앙일보 동경특파원과 인터뷰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상에 남았던 것이 대낮에도 별을 볼 정도로 시력이 좋았고,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격추되는 비행기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며 죽는 전우는 한명도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하느냐?”고 기자가 물으니 자기가 아는 한 한명도 빠지지 않고 ‘오카상(어머니)’을 외쳤다고 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들이 암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저는 평등하게 한번은 암컷이 낳고 다음에는 수컷이 낳고 하면서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종이 있었으면 벌써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딸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서 밥도 못 먹고 끙끙 앓으면 집사람은 같이 아파하며 마음까지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내가 아무리 애들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절대로 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거라고 느꼈습니다.
독서클럽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은 애들이 어릴 때 와이프가 자면서도 애기 울음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벌떡 일어나곤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감하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남편은 자느라고 바빠서 못들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된 게 ‘Mother’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섯 번째에도 들지 못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70번째에도 끼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며 아버지도 나름이겠지만 나부터 반성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니와 하늘에 계신 어머니들께도 존경과 사랑을 바칩니다.
어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황 근(육군학사장교 남가주동문회 고문)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편집국
Latest posts by 편집국 (see all)
- [나은혜 칼럼] 핑크빛 KWMI 한국대면말씀기도회 - 09/06/2024
- [나은혜 칼럼] 한여름의 의자나눔 프로젝트 - 08/21/2024
- [김현태 칼럼] 그가 걸음을 멈춘 까닭은? - 08/2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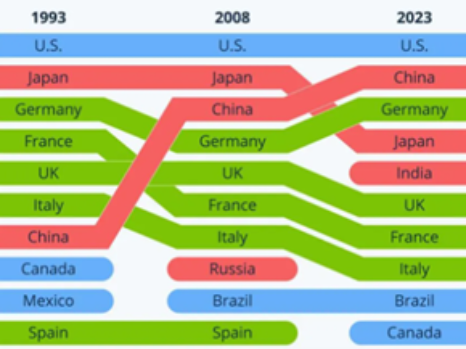



![[황 근 칼럼] 자식 같은 반려견](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6/20210615-황근-150x150.jpg)
![[황 근 칼럼] 큰딸의 휴가와 미국 이민자들의 사명](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4/황근-2-150x150.jpg)
![[황 근 칼럼] 5.16 혁명과 한국의 부흥](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5/516-기념식-60주년-150x150.jpg)
![[나은혜 칼럼] 때가 되면 이루리라!](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9/04/지은나교회-150x150.jpg)
![[세뇌탈출] 112탄 – 문재인!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교국가냐? 2부](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2/112-1-150x150.jpg)
![[정성구 칼럼] 가깝고도 먼 나라](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4/정성구-박사-150x150.jpg)
![[시사] 미국 LA에 울려퍼진 “반미주의자 손혜원은 물러가라”](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1/KakaoTalk_20180111_202308318-150x150.jpg)

![[나은혜 칼럼] 60대 신부의 꽃구두](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2/KakaoTalk_Photo_2018-12-23-20-45-18-150x150.jpeg)
![[나은혜 칼럼] 부모와 자녀관계의 미학(美学)](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0/05/나은혜-150x150.jpg)
![[최익주 연재] 21. “모두가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라는 사람에게](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1/20210113-최익주-원시-공동체-150x150.jpg)
![[나은혜 칼럼] 전도와 비지니스 그 중요한 한사람](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9/20210905-나은혜-150x150.jpg)
![[나은혜 칼럼] 성탄과 면역력 강화](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12/20211224-나은혜-150x150.jpg)
![[오피니언] 청와대 경호실의 탄저균 테러 치료제 비밀구입 실체를 밝히라](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7/12/art_15141117081581_b265a9-150x150.jpg)
![[최익주 연재]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와 ‘문재인의 ‘적폐청산’](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1/01/문재앙-150x150.jpg)
![[김태수 시론] 2022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전세계 경제 실마리 보이지 않는다…”](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22/05/다보스-150x150.webp)
![[동영상] ‘이재용 1심 재판’의 부적법성과 비도덕성을 심히 개탄한다!(3)](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7/09/1-1-150x150.jpg)
![[시사] 북한산 의심 석탄을 싣은 배, 2척에서 3척 더, 이번엔 9척?](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08/이미지-2-150x150.jpg)

![[시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LA 방문 큰 환영 받아](https://www.stimesus.com/wp-content/uploads/2018/10/KakaoTalk_20181004_120421122-150x150.jpg)